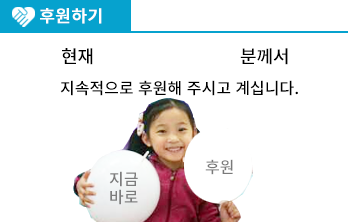[식민지 자료관 1]
조선부로수용소(연합군포로수용소) 탐방기
이순우 특임연구원
이번 호부터 새로 꾸며지는 「식민지 자료관」은 일제침탈사와 관련한 숨은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코너이며, 이순우 특임연구원의 기존 연재물인 「이 땅에 남아있는 저들의 기념물」과는 격월제로 게재될 예정이다. (편집자)
여기에 소개하는 ‘조선부로수용소(1942년 7월 5일 개설)’는 태평양전쟁의 확전 초기 단계에서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이 말레이반도를 거쳐 1942년 2월 15일에 싱가포르 지역을 장악하였고, 이때 십만여 명에 달하는 연합군 병력이 대거 포로로 전락하면서 생겨난 결과물이었다. 전투현장도 아니고 일본 본토도 아닌 곳에 난데없이 포로수용수가 설치된 것은 “반도인(半島人, 조선인)의 영미숭경관념(英米崇敬觀念)을 일소하고 필승의 신념을 확립시키기 위해 매우 유효하므로 …… 영미부로(英米浮虜) 각 1천 명을 조선에 수용하고 싶다”는 조선군사령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일이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42년 8월 16일 싱가포르 창이수용소에서 출발한 1천 명에 달하는 영국군 포로(호주군 100여 명 포함)가 3천 톤급 수송선 후쿠카이마루(福海丸)을 타고 1942년 9월 24일에 부산항을 통해 조선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날인 9월 25일 경부철도를 통해 용산역에 당도하여 삼각지와 용산경찰서 앞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조선부로수용소 본소(本所; 지금의 청파동 3가 100번지 신광여자고등학교 자리)에 안착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 포로들은 영등포역에서 분할되어 상인천역을 경유하여 인천에 있는 ’조선부로수용소 분소(分所)‘에 배치되었다.

일제는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전쟁수행을 위한 생산력 확충에 일조하도록 하겠다는 계략에 따라 1943년 9월에는 함경남도 함흥에 흥남(興南) 캠프가 새로 설치되어 경성과 인천에서 선별된 230명의 포로들을 이곳으로 재배치한 적도 있었다. 이들은 흥남에 있는 조선질소비료공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되었고, 이 인원은 추후 보충되어 총계 350명으로 증원된 것으로 알려진다.
연합군포로수용소에 갇혀 지내는 포로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 조선총독부관보 부록으로 발행되던 — 『통보(通報)』 제129호(1942년 12월 1일), 22~25쪽 부분에 「현지보고(現地報告) (12) 조선부로수용소(朝鮮俘虜收容所)」라는 — 당연하게도 일본인의 관점으로만 묘사된 내용이 그득하긴 하지만 — 글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그 단면의 일부나마 엿볼 수 있다.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의 혁혁한 전과(戰果)를 여실(如實)히 옮겨 조선(朝鮮)에도 부로수용소(俘虜收容所)가 설치되면서 다수의 부로(俘虜, 포로)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저들에게 있어서 이 생활은 어쩌면 전혀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이 무(無)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날이 왔다. 그 감격의 날이.
이날, 산은 갈라지고 바다는 몸부림치며,
사람들은 한숨을 돌리고, 눈을 번쩍 뜬다. 일순(一瞬)!
역사(歷史)는 거대하게 선전(旋轉)했다.
단호한 결의, 새로운 폭풍, 여기에 한 바퀴 돌아오는 대동아전쟁 1주년의 그날을 맞이하여 우리들 1억의 감격은 한층 더 깊고, 정전필승(征戰必勝)의 투지는 점점 더 굳어지면서도 진심을 느끼고 있지만, 같은 해를, 같은 해의 땅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선명한 패배(敗北)의 추상(追想)을, 무연(撫然)한 방심 (放心)에 이를 꽉 깨무는 사람들도 있다. 부로(俘虜)이다.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단벌 옷의 나그네 차림으로, 풀이 죽어 정신없이 일동(一同)이 이 조선으로 보내져 온 것은 가을빛이 아직 옅은 9월의 말이었다.
그리하여 이곳 경성 청엽정(京城 靑葉町, 지금의 청파동)의 ‘조선부로수용소(朝鮮俘虜收容所)’에서 그들의 제2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전부 남방○○작전(南方○○作戰)에서 살아남아, 시시각각으로 압축(壓縮)해오는 황군(皇軍)의 포위철환(包圍鐵環) 아래 만책(萬策)이 다하여 죽음의 직전에, 항복(降伏)에 의해 목숨을 건진 광영(光榮) 있는 — 그 광영은 이미 낡고 또 공허하지만 — 영(英), 호병(濠兵, 호주병사)이다.
그로부터 2개월, 그 가을도 두레박 떨어지듯이 저물고 어느 틈에 그 사이에는 흰눈이 찾아오는 것조차 보았다.
황급하게, 그런데도 짧지는 않았던 1년이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앞날은 아직도 멀다. 그것은 우리나라 의 대동아전쟁 완수(完遂)까지, 저들은 이곳에서 조국(祖國)의 몰락에 대기하는 것이다.
포로(捕虜)가 되어 무슨 목숨이냐고, 일본(日本)의 무사도(武士道)로써 저들을 힐책하는 것은 쓸데없 는 참견이라고 생각한다. 살아서 받는 수치도 죽는 것보다는 괜찮으며, 저들에게는 저들의 공식(公式) 이 있다. 여하튼 목숨이 있는 물종(物種), 저들은 목숨이 있는 한에는 싸웠고, 영미류(英米流)에서는 충분히 존경할 용사들인 것이다.
“우리들은 최후까지 싸웠다. 탈출의 길은 전혀 없었다. 승리의 길은 물론 없다. 그래도 최후까지 저항 했던 우리들의 용감함은 충분히 상찬(賞讚)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저들의 기댈 곳, 결코 포로가 되었어도 수치스럽지 않는 윤리(倫理)가 있다.
× × ×
저들의 안촉(顔觸, 면면)은 영(英), 호병(濠兵) 외에 프랑스병, 캐나다병 각(各) 1명(名)을 포함하고, 최고(最高)는 카쥬 중좌(カージユー中佐)의 58세(歲)부터 최연소(最年少)는 20세까지.
점심은 빵식(パン食)으로, 아침과 저녁은 일본식(日本食), 이미 미소시루(味噌汁, 된장국)와 다꽝(澤 庵, 단무지)의 맛에도 익숙해졌다. 소내(所內)는 장교(將校)를 제하고 10개 반(班)으로 나뉘어져, 아침에는 7시에 기상하고 취침은 9시, 정연(整然)한 규율생활(規律生活)이다. 2개월 사이에 아침저녁 점호(點呼)의 인원보고(人員報告)만큼은 완전히 일본어(日本語)로 할 수 있게끔 되었다.
“아리가토우(有難う; 고맙습니다).”
“오하요우(お早よう;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은 가장 일상(日常)의 소내회화(所內會話)로, 일본 및 일본어의 연구열(硏究熱)은 최근 엄청 난 것이 있으며, 매일의 『재팬타임즈(ジヤパンタイムス)』로 곧장 전황(戰況)을 알고, 『일본어 30시간(日本語 三十時間)』 등과 같은 책은 지금 다투어 읽히고 있다.
자신들은 어째서 패했던가, 왜 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건가.
일본인은 왜 강한가, 일본군의 강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강한 일본군이 어째서 또다시 이렇게도 넘칠 듯한 온정(溫情)의 지주(持主)인 것인가.
부로가 되면서 처음으로, 그릇된 지금까지의 생활방식을 반성하며, 그렇게 해서 일본의 국체(國體), 무사도의 진수(眞髓)에도 어렴풋하면서 그 위대함에 눈을 뜬 것이 있다.
× × ×
아침은 8시 반, 저들은 희희낙락하게 대오(隊伍)를 갖춰, 교대(交代)로 황국총후(皇國銃後)의 생산작 업에 참가하고자 수용소를 출발한다.
경성에는 시내(市內) 수개 소에 그들의 작업장(作業場)이 있다. 각 곳의 작업장에서 그들은 묵묵히 작 업에 힘쓰고 있다.
그 동작은 지극히 완만(緩漫)하여 오히려 답답한 점이지만, 유유(悠悠)한 한강(漢江)의 물살과 거대한 철교(鐵橋)를 배경으로 삼은 부로의 집단에게는 스스로 어떤 감개(感慨)를 금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 철교를 기차(汽車)는 하루에 몇십 회를 가리지 않고 굉음(轟音)을 남기며 지나간다. 기차가 오는 때를 기다려 하나, 둘의 눈동자가 작업하는 손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 되면 커다란 마도로스 파이프(マドロス パイプ)에 하급품(下級品)의 ‘사쿠라(さくら; 담배이름)’를 피우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모습을 뒤쫓는 것이다.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날마다 수백 회를 지나간다고 한들 지금의 저들로서, 이 기차는 단지 공허한 소음(騷音)에 지나지 않는다.
일체가 거대한 ‘정지(停止)’이다. 공백(空白)에 있는 ‘무(無)’이다.
시간은 흐르고, 시간은 간다. 모든 것이 소리도 없이 저들의 밖을 지나간다. 저들로서 지금은 모든 것 이 덧없는 것이다.
저들은 거의 말하지 않는다. 까마귀가 한 마리, 모래언덕 위에 우두커니 그 모습을 나타냈다. 눈앞에 3, 4척(尺)이다. 그리고 까마귀도 움직이지 않고, 사람도 쫓지 않는다.
응연(凝然)한 정지의 일척(一齣; 한 단락), 나는 이 속에서 공허함이 끝없는 부로(俘虜)의 ‘시간’을 느꼈다. 그것을 ‘고요한 조화(調和)’라고 부르며 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구는 일이다. 모든 것이 저들의 밖에 있다. 까마귀도 역시 저들의 밖에 있는 일체(一切)이다. 오직 확실해지고 있는 것은 저들에게도 생활이 있다. 일본국(日本國)의 부로로서, 그에 충실하게 준봉(遵奉)하는 가운데 저들의 유일한 존재(存在)가 있는 것이다.
부로인 현재(現在)가, 저들에게 있어 아무리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겠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영원의 무(無)로 끝맺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저들을 무화(撫化, 어루만져 감화시키는 것)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황국일본(皇國日本)의 위 대(偉大), 황도일본(皇道日本)의 이상(理想), 이것들을 통하여 세계에 광피(光被, 천황의 덕이 널리 미치는 것)하는 황국도의(皇國道義)의 고귀함을 배워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근로(勤勞)를 통해서, 혹은 소내(所內) 일상의 규율(規律)을 통해.
거기에 하나의 사상전(思想戰), 저들을 단지 먹이고 일을 시키고 있는 것만이 아닌, 원대한 부로수용 소 설립의 의의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 반도의 동포가 부로황화(俘虜皇化)의 제일선(第一線)에 있다. 이곳의 작업장에는 이날, 지난 6월의 모집(募集)에 응했던 임헌식(林憲直, 충남), 기본진월(杞本鎭月, 충남), 이부창인 (李阜昌仁, 전남 제주도)의 3군(君)이 있어서, 그들의 지도와 감시에 정전(征戰)의 고귀한 일익(一翼) 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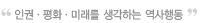
![img-top-introduce[1]](/wp-content/uploads/2016/02/img-top-history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