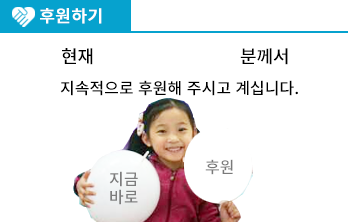[식민지 자료관 2]
시정기념관(옛 남산총독관저) 탐방기
이순우 특임연구원
남산 예장동에 자리한 서울유스호스텔(옛 안기부 본관)로 들어서는 초입에는 이 일대가 경술국치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통감관저 터’ 표석(2010년 민족문제연구소 세움)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은 원래 1885년 한성조약(漢城條約)에 따라 일본공사관이 들어섰다가 그 이후 차례대로 통감관저와 총독관저의 용도로 전환되어 사용된 공간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는 ‘망국(亡國)’의 치욕을 겪은 곳이지만 식민통치자들에겐 ‘한국병합의 대업(大業)’을 이룬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장소였던 것이다. 그러한 탓인지 1939년 9월에 경무대 총독관저가 신축되면서 빈터로 남게 된 이곳 남산총독관저는 역대 총독의 치적과 함께 그러한 사실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공간으로 전환되어 고스란히 보존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이른바 ‘시정기념관(始政記念館, 1940년 11월 22일 개관)’이다.
식민통치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시정(始政)’이라는 표현은 — 더러 ‘시정(施政)’이라고 적기도 하지만 —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더불어 신정(新政)이 개시(開始)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총독부가 출범한 10월 1일을 일컬어 ‘시정기념일’이라 하고 1915년 이후로는 이날을 아예 공휴일로 삼기도 했다. ‘시정’이라는 말에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통치로 인해 조선은 날로 번창하고 질서회복, 제도정리, 식산흥업 등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시정기념관 탐방기는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1940년 11월 11일자에 수록된 「[시정30년의 발자취, 13도 내고향 자랑이야기(お國自慢物語り) 경기도편(그 2)]시정삼십년기(始政三十年記)의 축도(縮圖) 왜성대(倭城台)에 여는 기념관(記念館)』[사카이 특파원(坂井特派員)] 제하의 글을 옮긴 것이다.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시정기념관의 수명은 불과 5년이었지만, 그들이 이 땅에 남겨놓은 폐해는 광복 80년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곳곳에 생채기를 남겨놓고 있다.
참고로, 이 글에 등장하는 시정기념관의 주임(主任, 관장)이라는 카토 칸카쿠(加藤灌覺, 1870~?)는 총독부 학무국 촉탁(囑託)과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촉탁 등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조선역사지도 편제사무, 조선어 편집사무, 조선의 관습 및 고도서 조사, 고적조사사무, 민족자료의 조사수집사무, 조선미술심사위원회 서기 등의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이다. 일제 패망 이후에는 — 김재원(金載元) 국립박물관장의 증언에 따르면 —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인 처(妻)의 성을 따라 ‘이관각(李灌覺)’으로 이름을 바꿔 국내에 잔류하였다가 한국전쟁 직전에 숨졌다고 알려진다.
유수(幽遂)한 수립(樹立)에 둘러싸인 남산의 기슭, 지금은 사는 이의 자취도 없는 왜성대 구관저(舊官邸)의 색이 바랜 붉은 건물이 크림색의 펭키[페인트]로 다시 태어난 듯한 근대적인 명장(明粧)을 더해질 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며 의아했을 게 틀림없다. 그리고 명치 39년(1906년) 이토 통감(伊藤統監)의 내임(來任) 이래 역대 총독의 관저로서, 또한 저 일한병합(日韓倂合)의 역사의 일척(一齣, 한 단락)이 크게 흔들리던 순간 그 극적 조인(調印)이 성립한 장소로서, 반도통치 30년의 발자취에서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가운데 그 역사적 표징(表徵)으로서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왔던 건물이, 광고(曠古, 전례가 없음)의 식전(式典)과 겹쳐 시정 30주년의 서광을 입고 거기에 곁들여 ‘조선총독부시정기념관(朝鮮總督府始政記念館)’이 생기면서 이를 대신하여 수많은 기념품을 간직하여 영구히 그 역사적 광휘를 자랑하여 이어나간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저도 모르게 쾌재를 부르짖을 것이다. 우가키 전총독(宇垣 前總督) 시대부터의 현안(懸案)이던 그 빛나는 계획은 가경(佳慶)한 기념사업으로서 총독부 학무국 카토 칸카쿠(加藤灌覺, 72세) 씨의 예사롭지 않은 노력과 지금 1인의 독지가(篤志家)의 정재(淨財)에 따라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지금 1인의 독지가라는 것은 카토 씨의 구지(舊知, 오랜 지인)인 도쿄시 시바구(東京市 芝區) ‘와카모토(わかもと)’ 본포사장(本舖社長) 나가오 킨야(長尾欽彌) 씨로, 그 계획을 재빨리 듣고는 기념관의 유지비(維持費) 및 경상비(經常費)로서 흔쾌히 10만 원(円,엔)의 사재(私財)를 던져 관계자들 사이에 아름다운 화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반도통치의 금자탑(金字塔)의 제막이라고도 할 ‘시정기념관’의 개관은 전반도(全半島)의 주시(注視)와 기대(期待) 속에 드디어 오는 15일을 기하여 행해지는데, 현재 카토 씨 고심(古心)의 수집(蒐集)이 되는 200여 점의 기념품 여러 가지로 문자(文字) 그대로 ‘시정 30년의 발자취’를 상기해보자.
× × ×
우선 ‘왜성대(倭城台)’의 기원에 대해 동씨(同氏)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부터 약 삼백팔, 구십 년 옛 이조(李朝, 조선) 제11대 중종왕(中宗王) 대의 대신이던 이행(李荇)이라는 학자가 남산을 등진 계류(溪流)에 임한 이곳의 지상(地相, 지형)을 골라 처음으로 별장(別莊)을 지어 ‘남산록(南山麓)’이라고 칭하자 귀현(貴顯)의 왕래가 빈번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문록역(文祿役, 임진왜란) 때는(이조 제14대 선조왕) 경성(京城; 당시는 ‘한성’)에 공략해 온 고부교(五奉行; 토요토미 정권의 정무를 분장한 다섯 명의 측근)의 한 사람인 마시타 나가모리(增田長盛)의 진소(陳所)가 되었고, 여기에 일본류(日本流)의 성(城)을 구축하여 그 이래로 ‘왜성대’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의 유적(遺跡)으로서 현재의 건물 앞 대공손수(大公孫樹, 큰 은행나무)는 ‘우마츠나기(馬繫ぎ, 말을 매어두던 곳)’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이(星移; 세월이 흐르는 것)하여 이조 제25대 철종왕(哲宗王)의 대신 박영원(朴永元)이 역시 이곳 수석(水石)의 경치를 동경하여 별장으로 삼아 ‘녹천(綠泉)’으로 부르던 부근 약수의 이름을 따서 ‘녹천정(綠泉亭)’이라는 초막을 지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 건물을 세워서 왕후귀족(王侯貴族)과 왕래하며 남산록의 일명승(一名勝)이 되었는데, 박(朴)의 몰후(歿後)에는 그 관계자의 소유가 되어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명치 18년(1885년)에 조선정부로부터 일본공사관(日本公使館)의 부지(敷地)로 위양(委讓)되었던 것이며, 동(同) 39년(1906년) 1월의 철퇴(撤退)까지 일본공사관은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명치 39년(1906년) 3월 2일에는 이토공(伊藤公)이 통감(統監)으로 내임(來任)과 동시에 조선통감관저(朝鮮統監官邸)가 되었고, 계속하여 테라우치 초대총독(寺內 初代總督) 이래 30여 년, 작년 9월에 현 미나미 총독(南總督)이 경무대(景武台)의 신관저로 옮겨가기까지 유서(由緖)있는 토치가라(土地柄, 그 지방의 풍속)입니다. 또한 이토공의 재임 당시, 즉 명치 40년(1907년) 10월에는 당시 황태자전하(皇太子殿下, 대정천황)께서 어도선(御渡鮮)하시어 여기를 행궁(行宮)으로 삼아 5일간 어체제(御滯在)하시던 곳이기도 하며, 게다가 명치 43년(1910년) 8월 병합(倂合)의 역사적 조인(調印)의 부옥(部屋, 방)도 당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안내를 할까요?
그리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장자(壯者, 장년의 나이)를 능가하는 튼튼한 걸음걸이로 앞장선 이 노고학자(老古學者)에 뒤이어 기자(記者)는 나도 모르게 마음의 이끌림을 느꼈던 것이다.
× × ×
[계하(階下) 제1호실(第一號室)] 하세가와 2대 총독(長谷川 二代總督)이 착용했던 육군통상복(陸軍通常服)과 금몰(金モール, 금실로 짠 직물)의 예복(禮服), 일청전쟁(日淸戰爭, 청일전쟁) 당시 조골(助骨, 늑골)에 걸쳤던 군복 3착(着, 벌)이 각각 커다란 유리장(ガラス張り)의 진열상(陳列箱)에 장식되어 있다. 예복의 가슴에는 금치훈장 공일급(金鵄勳章 功一級)을 비롯하여 프랑스의 레종 드 뇌르 훈장, 도이치의 적취(赤鷲, 붉은 독수리) 일등훈장(一等勳章) 등 10개가 넘는 훈장이 찬연하게 빛나고 있다. 벽(壁)에는 유화(油畫)의 초상(肖像), 탁자 위에는 황공하옵게도 대정천황(大正天皇)께옵서 동(同) 원수(元帥)에게 하사한 군도(軍刀) 1구(口, 자루)가 오동 상자에 들어있으며, 그밖에 이 방의 한 곳에는 진귀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이토공이 나폴레옹 3세 시대의 프랑스로부터 가지고 온 커다란 ‘오르골(オルゴール)’이다. 핸들을 감아서 그 옛날 현관귀녀(顯官貴女)의 무리가 그 묘한 태서(泰西)의 연주소리에 무도회(舞蹈會)를 열었다고 하는 절로 미소 짓는 정경이 눈앞에 떠오른다. “서양인이 봐도 이렇게 큰 것은 드물고, 지금도 2, 3천 원(円, 엔)은 확실하다고 칭찬되었지요.”라며 카토 씨는 만열(滿悅)이다.
[제2호실(第二號室)] 사이토 3대 총독(齋藤 三代總督)의 세비로(背廣, 평상양복)와 해군대장(海軍大將)의 하얀 하복과 모자가 유리진열상에 넣어져 있다. 바로 앞 작은 상자에 면(綿)으로 감싸놓은 보석(寶石) 같은 것과 짧은 패검(佩劍)에 붙은 대혁(帶革, 허리띠)이 눈길을 끄는데, 이것은 대정 8(1919 년) 9월 2일 오후 5시 착임(着任)하는 경성역두(京城驛頭)에서 불령분자(不逞分子)의 폭탄을 받아 위난(危難)에서 벗어날 때 패검의 혁대에 남아 있던 파편(破片)을 꺼낸 것이다. 검고 작은 환물(環物)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거대한 역사의 변전(變轉)에 기자(記者)는 송연(悚然)함을 느꼈다. 모서리의 케이스(ケース)에는 동(同) 총독이 전남순시(全南巡視) 때 고려소(高麗燒, 고려자기)의 요적(窯跡, 가마터)에서 습득하여 모은 도기(陶器)의 파편, 그다음에 거상(居常, 평상시) 머리에 올리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관(冠)과 같은 검은 조선풍(朝鮮風)의 중모자(中帽子)는 동(同) 대장 일면의 치기(稚氣)를 유감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벽에는 착임하던 날 출영(出迎)에 답례(答禮)하는 사진과 평복(平服)의 초상이 걸려 있다.
[제3호실(第三號室)] 여기도 사이토 총독의 방인데, 자필(自筆)의 괘축(掛軸, 족자)이랑 왜성대 관저에 문인묵객(文人墨客)을 초대하여 아회(雅會, 글짓기 모임)의 석상에서 휘호(揮毫)한 것 등이 놓여 있다. 그중에는 ‘고수(皐水)’의 아호(雅號)로 “新情舊話會群賢 亦是風流未了緣 有酒滿樽須盡醉 傲霜殘菊小春天(새로운 정 옛 얘기로 숱한 현인들이 모였나니/ 역시 풍류는 아직 인연을 다 맺지 못하였네/ 단지에 가득 술이 있어 실컷 취하고자 하나니/ 때는 심한 서릿발에 남은 국화가 있는 소춘[음력 시월]이로다)” 등과 글을 쓴 것이 있다.1 “술은 동이에 가득하여 실컷 취하리니 ……”라며 낭영(朗咏, 시를 읊는 것)하는 카토 씨는 “딱 지금 무렵의 일이었군요.”라며 주(註)를 더했다. 같은 방에서 눈을 돌리면, ‘2.26사건’ 직전 동(同) 대장이 사저(私邸)에서 상용(常用)했던 양궤(洋机, 서양식 책상), 조도류(調度類, 가구류)가 당시 그대로 꾸며져 있고, 케이스의 식기류(食器類), 선(膳, 밥상) 등을 보고 있자니 저 애처로운 충격(衝擊)의 추억이 일순간 뇌리를 스쳤던 것이며, 반개(半開)되어 있는 책상의 인출(印出, 서랍)의 한쪽에는 하작(荷作, 짐)에 딸려 있던 설뉴류(屑紐類, 자투리 노끈)가 하나하나 정성껏 둥글게 말아서 가득 보존되어 있다. 별도의 서랍에는 전정협(剪丁鋏, 가지치기가위)이랑 금추(金鎚, 쇠망치) 등 동량대공(棟梁大工, 도목수)의 도구가 대수롭지 않게 넣어져 있으며, 책상 위 하드롱지(ハトロン紙, 골판지) 봉통(封筒, 종이주머니)에는 황족방(皇族方, 황족분)의 사진을 신문에서 잘라 낸 것이 정중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볼 때 동 대장 거상(居常, 평상시)의 인간미(人間味)가 풍성하게 넘 쳐흐르고 있음을 느낀다.
[이계(二階) 제1호실(第一號室)] 상(床)에는 프랑스제 자홍색(紫紅色) 화문(花紋)의 융단(絨緞)이 깔려 있고 같은 색의 커텐(カーテン)이 창에 걸렸으며, 암홍색(暗紅色)의 실내광(室內光) 속에 떠올라 있는 중앙의 테이블(テーブル)과 의자(椅子) 6각(脚)이, 난로 위 벽에 끼워넣은 커다란 거울에 그 영상(映像)을 드리고 있다. 팔첩(八疊, 타다미 8개 넓이)의 양실(洋室)은 명치 43년(1910년) 9월 일한병합조약(日韓倂合條約)의 역사적 조인이 행해진 방이다. 반도의 여명(黎明)은 이 방의 창으로부터 맨 먼저 그 역강(力强, 강력)한 산성(産聲, 갓난아이의 첫 울음소리)을 발하였다. 적라사(赤羅紗)의 모서리가 깨져 있는 책상의 위에는 잉크병(インク壺)이 2개(個)가 있고, 녹색의 유리제 잉크스탠드가 반도 30년 역사의 1엽(頁, 페이지)을 엄숙하게 썼던 그 순간 그대로, 잉크의 흔적을 요요(黝黝, 거무칙칙)하게 달라붙게 하여 투명한 광망(光芒, 빛발)을 고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2, 제3호실(第二, 第三號室)] 이왕 전하(李王殿下)께서 황태자 시절(명치 40년; 1907년) 하세가와(長谷川) 주둔군사령관에게 증정했던 ‘충신간로(忠信干櫓;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나오는 말로, 충과 신을 방패로 삼는다는 뜻)’의 편액(扁額)이랑 테라우치 총독이 이왕 전하를 초대, 조선정부의 여러 대신 및 문인묵객(文人墨客)과 함께 썼던 ‘요세가키(寄せ書き; 여럿이 한 종이에 글씨를 쓴 것)’ 종류랑, 또 그들 문인묵객 등의 손으로 된 여러 본(本)의 족자와 편액이 곳곳에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어서 당시 반도(半島)의 혁신적 지도자들이 극무(劇務, 격무)의 사이에 곧잘 청요아회(淸謠雅會)를 열어 한일월(閑日月)을 즐겼던 모습이 손에 잡힐 듯이 그리웠다.
× × ×
이상 3백여 점(点)의 기념품 중에는 지금의 상황에 야마나시(山梨), 우가키(宇垣) 양(兩)총독 시대의 기념품이 눈에 띄질 않는데, 이것들 모두 다 가까운 시일 내에 도착, 진열되리라 기대한다. 고대하는 개관(開館)은 15일부터 개개(蓋開, 개시)하지만, 5일간의 개방(開放, 관람무료)을 가지고서 우선 오는 춘사월(春四月)까지 휴관하고, 그 사이에 미수집품(未蒐集品)을 완비, 진열케이스, 난방 등의 설비를 정돈하기로 되어 있으며, 또한 동(同) 기념관의 개관식은 22일 성대하게 거행된다.
1. 조선총독부의 기관지(機關誌)인 『조선(朝鮮)』 1924년 1월호에 수록된 「사단(詞壇), 왜성대아연집(倭城臺雅筵集)」(130~133쪽)에는 여기에 나오는 사이토 총독의 칠언절구 ‘석상색화(席上索和; 이 자리의 화합을 모색하며)’를 비롯하여 이를 차운(次韻)한 이완용(李完用) 이하 참석자 총 31명이 지은 한시가 전부 소개되어 있다. 이완용의 전기이자 문집이기도 한 『일당기사(一堂紀事)』(1927)의 연보(年譜), 755쪽에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이 행사는 1923년 11월 25일 총독관저에서 열린 ‘이문회 회원 초대 연석(以文會 會員 招待 宴席)’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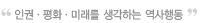
![img-top-introduce[1]](/wp-content/uploads/2016/02/img-top-history1.png)